2008년 공황 이후 지금까지 상황에 비춰 보면:
케인스와 마르크스 둘 중 누가 옳았는가?
〈노동자 연대〉 구독
최근 세계경제 지표가 더 나빠질 것 같다. 실질GDP로 볼 때 세계경제는 더 악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 자본주의 국가 중 가장 낫다던 미국 경제도 2016년 1분기 성장률이 0.5퍼센트를 기록해 지난 2년 만에 가장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미국을 제외한 선진 7개국 중 2퍼센트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이룬 나라는 영국(2.2퍼센트)뿐이다. 그렇지만 영국도 2016년 1분기 성장률은 0.4퍼센트를 기록해 2012년 이후 가장 둔화한 모습이다. 2016년 1분기 유로존 경제는 0.55퍼센트 성장해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약간 나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대체로 세계의 주요 경제들은 여전히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대불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류 경제학자들과 연구소들은 대부분 세계경제의 지표가 최근에 나빠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세계경제가 대불황에 빠져 있다는 분석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5월 초, 골드만삭스의 수석 경제학자 출신으로 BBC 회장과 영국 정부의 경제자문관을 역임했던 케인스주의 경제학자 가빈 데이비스는 GDP 지표가 과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뿐, 미래의 상황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경제 활동은 2014년 이래로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추세(3.6퍼센트) 아래이고, 2015년 2월과 8월 그리고 2016년 2월에는 경제성장률이 2.5퍼센트 아래로 추락”했지만, 세계경제는 “대대적 침체가 임박했던 상황에서 벗어났다”며 그리 걱정할 것 없다고 주장했다.
주요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성장률 데이터를 살펴보면, 2007~15년의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 0.5퍼센트는 1998~2006년 1.5~2퍼센트보다 더 낮았다. 이런 차이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로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탈리아는 2007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프랑스는 거의 정체 수준이다. 실질GDP 성장률이 이전 시기의 평균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시기가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그림)

그런데 제러미 코빈이 이끄는 영국 노동당의 경제자문이자 옥스퍼드대 교수인 사이먼 렌-루이스는 지난 10년 동안 저성장 또는 경기침체를 보인 이유가 2008년 시작된 대불황의 여파와 뒤이은 긴축 정책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록 분명하게 주장하진 않지만 대불황이 수요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그는 노동당의 또 다른 경제 자문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다음과 같은 말을 지지할 것이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번 위기의 근저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중 하나는 글로벌 총수요의 부족이다.”
스티글리츠는 이렇게도 주장했다. “케인스가 인식한 문제는 임금이 너무 유연하다는 점이었다. 사실 임금이 하락하면 사람들의 소득도 하락하고 따라서 재화에 대한 그들의 수요도 하락한다. 1929년 대공황에서 총수요의 부족이 문제였는데, 오늘날에도 총수요의 부족이 문제다. 임금을 더욱 유연하게 하는 것은 총수요의 부족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케인스 전기 작가로 유명한 로버트 스키델스키 교수는 저축 과잉 이론을 들고 나왔다. “이번 위기의 근원은 미국 경제의 새로운 투자가 활성화되기 전에 동아시아에서 저축이 너무 빠르게 증가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도 뒤집어 보면 수요 감소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소득이 저축과 소비로 이뤄져 있어 저축의 증대는 수요의 감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케인스주의자들이 1929년 대공황이나 2008년 대불황이 수요 부족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도로가 젖어 있는 것은 오늘 비가 왔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케인스주의자들의 주장은 설명이 아니라 기술(記述)에 지나지 않는다. 왜 오늘 비가 왔는지 그리고 비가 오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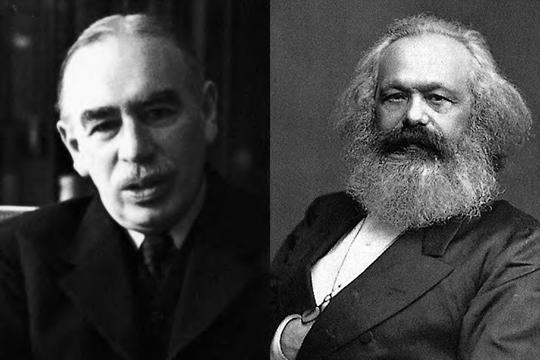
△자본주의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한 상반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 케인스(왼쪽)과 마르크스(오른쪽).
케인스주의자들이 볼 때, 대불황이 끝나지 않고 장기 불황으로 바뀐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대불황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국 정부의 긴축 정책이다. 케인스주의자들은 첫째 이유보다는 둘째 이유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긴축은 수요에 충격을 가했고, 낮은 수요는 산출과 고용을 낮췄으며,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기업의 가격 인하는 물가 하락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수요와 고용 그리고 산출을 대불황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실질금리를 낮추게 됐다.
그런데 현실은 케인스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움직였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음에도 수요와 고용 등이 늘어나지 않았다. 저금리의 금융 완화 정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2008년 당시 미국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는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많은 돈을 공급해 줬기에 ‘헬리콥터 벤’[헬기로 돈을 뿌린다는 말에 빗댄 표현]으로 불렸다. 그런데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중앙은행의 유럽안정화기금(ESM) 및 무제한 국채 매입, 일본판 양적완화인 아베노믹스 등이 추진됐음에도 장기 불황은 끝나지 않았다.
케인스주의자들은 불황의 원인을 긴축 정책으로 지목했지만, 정작 각국 정부들은 대불황에 직면해 재정지출 확대, 저금리 정책 등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경기부양책들은 효과가 없었다. 그 이유는 (케인스주의자들의 진단과는 달리) 대불황과 장기불황의 원인이 긴축 정책으로 인한 수요의 부족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투자 부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가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윤율이 하락했고 또 이윤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윤의 변화가 투자와 수요(소비)의 변화를 초래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이 점에서 소득 주도 성장론처럼 소비를 늘려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론과 현실 모두에서 들어맞지 않는다.
최근에 이윤에 관한 실증 연구를 한 호세 타피아 그라나도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투자가 축소되고 임금이 하락하는 침체가 시작되기 몇 분기 앞서서 이윤이 증대하는 것을 멈추고 정체하다 하락하기 시작함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 다국적기업들의 이윤 증가율이 거의 제로 수준으로 하락했고, 미국의 다국적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투자가 위축될 것이고 그러면 주요한 경제들이 새로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필자가 본지 173호에 쓴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미국 경제 호황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참조)
GDP에서 개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경우 70퍼센트, 한국은 55퍼센트에 이르기 때문에 주류 경제학자들은 소비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역동적이게 만드는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 등은 개인 소비가 아니라 기업 투자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마르크스가 말한 이윤율, 즉 투자 대비 이윤의 비율이다.
케인스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린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통설과 달리 1930년대 대불황을 끝낸 것은 케인스의 정책이 아니었다. 미국은 1933~36년에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상당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1937년 가을 역사상 가장 급격한 경기후퇴를 피할 수 없었다. 결국 제2차세계대전으로 전시경제가 시작되면서 국가가 투자에 대한 중요한 결정권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 1943년 미국의 국가는 총투자의 90퍼센트를 차지했다.
1930년대 대불황이 전시경제를 통해 해소된 역사적 사례는 케인스주의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스키델스키는 1930년대 대불황에 대한 케인스의 제안이 모두 “재계의 심사를 건드리지 않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케인스는 정부 지출과 계획 그리고 회복을 사회개혁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인스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린 또 다른 예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장기(30년에 걸친) 호황이다. 케인스주의자들은 적자를 감수한 재정지출과 정부가 유도한 생산을 통해 전후 호황을 달성했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달랐다. 전후 총투자에서 공공부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양차 대전 사이 시기보다 평균적으로 더 낮았다. 따라서 재정 확대가 아니라 재정 긴축이 당대의 실천이었던 것이다. 전후 시기 내내 국가는 체제에 수요를 공급하기는커녕 줄곧 대규모 흑자재정을 유지했다. 그래서 1970년대까지 정부 개입의 주된 형태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성장 속도를 늦추기 위한 ‘금융긴축’이었다.
장기호황이 끝나고 1974년 선진국 경제들이 경기후퇴에 직면하고서야 정부들은 필사적으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케인스주의 정책에 의존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케인스주의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1970년대 후반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기가 도래했는데, 이는 이윤율 하락 위기에 직면한 지배자들이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이윤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의 결과였다.
1970년대 중반 이래로 케인스주의 정책들은 전후의 장기호황과 같은 황금기는 고사하고 당면한 불황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같은 케인스주의 정책들이 시행됐지만 세계경제는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케인스주의가 정책을 통한 실천에서 드러낸 실패는 ‘유효수요 부족 때문에 불황이 도래한다’는 이론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본주의는 자본들 사이의 경쟁과 축적에 의해 작동하는 체제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해서 축적을 해야 하는 경쟁 압력에 종속돼 있다. 이 때문에 자본가들에게는 ‘투자수익률’, 즉 마르크스주의 용어로 하면 이윤율이 중요해진다. 각국이 초저금리 정책을 펴고 양적완화를 통해 자금을 시중에 공급하는데도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효수요의 부족이 아니라 이윤율이 낮기 때문이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주류 경제학에 대한 신뢰는 크게 무너졌다. 그러나 케인스주의도 자본주의 위기뿐 아니라 2008년에 시작된 대불황의 원인과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론》의 저자인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이 자본주의의 동역학과 경제 위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 더 읽으면 좋을 책으로는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정성진 엮음, 책갈피), 《크리스 하먼의 마르크스 경제학 가이드》 (크리스 하먼 지음, 책갈피), 《부르주아 경제학의 위기》 (크리스 하먼 지음, 책갈피)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