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호황과 거대언어모델의 거품
〈노동자 연대〉 구독
AI 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인류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우려와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 AI 산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12일 브로드컴의 CEO 호크 탄은 “빠르게 성장하는 AI 매출이 비AI 매출보다 총마진이 더 작다”고 밝혀 주가가 폭락했다. AI 산업이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오픈AI를 비롯한 거대 빅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왔다. AI 투자에서 선두에 선 아마존은 올해에만 1,050억 달러(154조 원)를 투입할 계획이고, MS 800억 달러(117조 원), 구글 910억 달러(133조 원), 메타 700억 달러(102조 원), 오라클 400억 달러 등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경쟁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 가운데 상당수가 수익을 얻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딥마인드를 개발해 AI 분야의 선구적 기업으로 알려진 구글은 최근 제미나이3 모델을 발표했다. 구글의 약진은 엔비디아-오픈AI-오라클의 AI 연합에 위협적이다. 제미나이3가 오픈AI의 챗GPT5나 앤스로픽의 클로드 소네트4.5보다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을 뿐 아니라, 구글은 엔비디아의 GPU 일부를 자체 제작해 더 저렴한 TPU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2016년부터 브로드컴과 협력해 TPU와 주문형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구글과 오픈AI 진영의 AI 주도권 경쟁이 당분간 더욱 치열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오픈AI는 구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서둘러 챗GPT5-2 모델을 내놓았다. 앞으로도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투자 경쟁에 내몰릴 것이다.
중국 AI 딥시크의 출현도 미국 AI 산업에 또 다른 충격을 주었다. 저비용 고효율의 딥시크가 등장하자 미국 AI 산업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공짜 전력을 무제한 사용한 딥시크와의 가성비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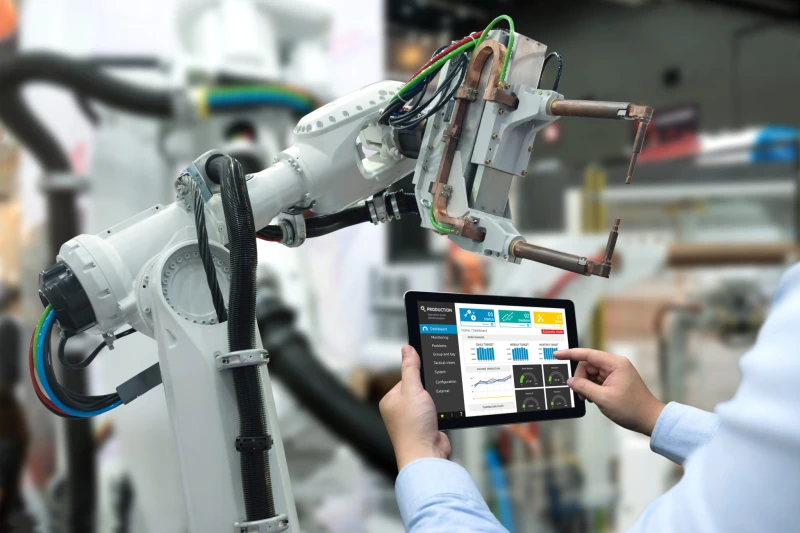
AI에 베팅한 미국 경제
천문학적인 AI 투자 경쟁은 이제 미국 경제 전반을 뒤흔들 정도로 거대해졌다.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은 2022년 이후 4년 동안 AI가 미국 경제를 약 1,600억 달러, 즉 미국 GDP의 0.7퍼센트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이 수치를 연간 경제성장률로 환산하면 약 0.3퍼센트포인트에 이른다. 빅테크 기업과 관련한 시설 투자가 미국 실질 GDP 성장의 40퍼센트에 이르는데, 그 대부분이 AI와 관련된 투자다. AI 관련 투자가 오늘날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부문인 셈이다.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 경쟁이 거품을 키워 미국 경제를 위기로 이끌 수 있다. 올해 미국 주식시장 상승의 80퍼센트는 AI 기업의 주가 상승이었다. AI 산업에 대한 장부상의 투자 금액과 주식 가격의 격차가 2000년 닷컴 버블 때보다 17배나 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 때보다 4배나 크다.
그래서 록펠러 인터내셔널 회장 루치르 샤르마는 “미국이 AI에 거대한 베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붐이 지속되고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수혜를 볼 것이라는 시장의 강한 믿음”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이슨 퍼먼도 빅테크 관련 투자가 미국 GDP의 4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올해 상반기 GDP 성장의 92퍼센트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올해 미국 경제가 3퍼센트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매그니피센트 7’(일곱 개의 빅테크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실적을 제외하면 미국 경제의 올 상반기 성장률은 0.1퍼센트 상승에 그친다.
문제는 AI 투자가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다.
현재로선 AI 산업의 성과가 초라하기 그지없다. 전 세계 오픈AI 사용자 수는 8억 명 내외이지만 유료 사용자는 2퍼센트에 불과하다. 게다가 AI 성능 향상에는 갈수록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 챗GPT3 출시 비용은 5,000만 달러였지만, 그 후 챗GPT4는 5억 달러, 챗GPT5는 50억 달러가 들었다. 유료 전환율이 획기적으로 증대하지 않는다면 AI 개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AI 수익은 투자 증대를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JP모건의 예상에 따르면, AI 산업이 연 10퍼센트의 수익을 내려면 2030년까지 연간 6,500억 달러(957조 원)를 벌어야 한다. 이는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의 2024년 매출의 갑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막상 AI 사용자들이 충분히 비용을 치를 태세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다. AI를 통한 생산상 향상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특히 AI가 생성한 콘텐츠 품질이 조야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보도를 보면, AI를 도입한 기업의 95퍼센트가 측정 가능한 수익을 얻지 못했다고 답했다. AI 도구를 사용하는 사무직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퍼센트가 AI 사용으로 생산성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답했다. AI로 시간을 절약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조차 실제로는 생산성 손실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워크 슬롭’ 문제 때문인데,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전문적으로 보여도 실제로는 장황하고 반복적이며 심지어 부정확해서, 이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데 추가로 많은 시간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윤율이다
AI 산업이 수익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을지 하는 우려는 AI 거품에 대한 우려로 연결된다. 지난 3년 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막대한 AI 투자에 주로 자신들이 벌어 놓은 이윤을 사용했다. 이제 자신들이 벌어 둔 자금이 바닥나자 외부에서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오늘날 AI 산업에 대한 엄청난 투자는 1840년대 영국과 1870년대 미국의 철도 버블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한다. 그 당시 철도는 운송을 혁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기술로 여겨져, 수많은 기업들이 신규 철도 건설에 나섰다. 그러나 1870년대 초에 주식시장의 거품이 터지면서 철도 광풍도 끝났고 1890년대까지 세계적 불황이 이어졌다.
현재의 AI 투자 붐은 19세기 철도 투자 규모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철도 투자는 미국 GDP의 6퍼센트에 이르렀지만 AI 관련 전체 투자는 GDP의 4퍼센트 수준이다. 그런데 AI 투자 증가세로 볼 때 철도 광풍의 수준에 이를 날이 멀지 않았다.
AI 기업들이 ‘사모 금융’을 이용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AI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더 늘려서 수익성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
또, AI 핵심 기업들의 ‘순환 투자’ 구조도 위험도를 높인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투자하면 오픈AI는 이 자금으로 오라클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요청하고, 오라클이 다시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AI 칩을 엔비디아에서 구매하는 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 부총재인 기타 고피나트는 닷컴 버블 붕괴와 같은 수준의 AI 거품이 터질 경우 미국 내 가계 자산은 20조 달러, 해외 자산은 15조 달러가 증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영화 〈마진콜〉의 실제 모델)도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을 부풀려 버블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AI 산업이 인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그 결말을 보기 전에 AI 투자에 대한 거품이 터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